[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우리는 아름다움 곁을 무심히 지나치거나 간단히 훌쩍 건너뛰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아름다움이 어느 날 사라진다면 아마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소리 높여 불평하리라.” (p113)
일상은 아름다움으로 피어나는 기적이다. 그 은폐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의 나이테를 하나씩 그어가는 우리네 삶의 의미이리라. 이야기는 독일 라인강변 작은 마을 베스터발트에서 펼쳐진다. 그야 말로, 시골이다. 숲이 우거지고, 그 숲을 따라 누군가는 거적때기 같은 삶을, 또 누군가는 주술처럼 반짝이는 삶을 살아간다.
주인공 루이제의 할머니는 젤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1인칭 시점의 소설은 루이제가 성인으로 성장하가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닮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세월의 흐름으로. 그러나 정작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는 점을 모르고 살아간 내 내면에 대한 부재이며, 오롯이 그것은 모든 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 가장 슬프게 각인된다.

이야기 속에서 죽음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으로 치환된다. 죽음은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다. 늘 우리 곁에. 그러나 이 소설에서 죽음은 신사적이다. 소설 속 의인화된 죽음은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하게 남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더 슬프다.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지 못한 사실은 늘 ‘죽음’처럼 우리 곁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루이제가 열 살이 되던 해 젤마는 꿈을 꾼다. 그녀가 오카피(20세기 들어서 처음 발견된 포유동물로 종아리는 얼룩말처럼 생기고, 엉덩이는 맥, 몸통은 기린처럼 생긴 데다 노루의 눈과 쥐의 귀를 지닌 아름다운 동물로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며 환상 속 동물이 아니다)를 보면 꼭 마을에서 누군가는 죽어나간다. 그게 미신처럼 마을을 부유하면서, 젤마가 오카피를 보는 꿈이라도 꾸면 죽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죽기 전에 털어 놓아야 할 진실 편지를 주고받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팔름의 위기로 연계된다. 팔름은 술꾼이고, 매우 난폭한 사람인데, 루이제의 단짝 친구인 마르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팔름은 마르틴을 학대하고, 젤마는 그런 팔름으로부터 마르틴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실 젤마가 꿈을 꾸기 전 참다못한 젤마의 친구, 안경사가 팔름을 살해하기 위해서 팔름이 자주 올라가는 망루의 다리에 톱질을 했다. 올라갔다가 망루가 무너지면서 낙상사고를 당하길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젤마가 꿈을 꾸면서 누군가는 죽는다는 진실이 안경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가까스로 안경사는 술에 취한 팔름이 죽는 걸 막는다. 이때까지는 젤마의 꿈은 무력화가 되어 더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는다.
그러나 바로 몇 시간 뒤 열차사고로 팔름의 아들이자, 루이제의 단짝인 마르틴이 열차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젤마의 꿈의 저주가 실현된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루이제는 깊은 성장통을 겪으며 스물두 살을 맞는다. 성인이 된 루이제는 이웃마을 서점에서 수습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간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정신없이 변한다.
평소 철이 없던 아버지는 바깥세상을 보고 오겠다며 세계일주라도 할 심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녔고, 아버지에게 실망한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사귀며 루이제에게 큰 도움이 못 된다. 그 와중에 루이제가 믿고 따르는 건 할머니 젤마와 그녀를 연모하는 안경사,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온 특이한 품종의 대형견 알래스카뿐이었다. 이 변함없는, 그리고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상은 루이제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런 루이제의 삶에 균열이 생긴다. 알래스카가 집을 나가면서 만나게 된 수도승 프레데릭에게 빠지게 된다. 그런데 프레데릭과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수도승인데다가 그가 거주하는 곳은 독일 반대편에 있는 일본이었다. 그 후로도 10년 동안 프레데릭과 편지를 주고 받지만 프레데릭은 루이제를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 수도승의 삶을 선택하고 쉽게 루이제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젤마가 죽게 되면서, 루이제는 다시 프레데릭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뭐랄까. 이 소설 속 이야기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다. 누군가 꿈을 꾸면 꼭 누군가 죽는다는 미신은 사실 그 어느 나라의 그 어느 마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특별할 게 전혀 없는 플롯을 특별하게 이끌어가는 게 마리아나 레키만의 연금술이다. 특히 상황을 의인화하는 독특한 묘사는 시종일관 독자가 이야기의 꼬리를 부여잡게 한다. 그녀의 연금술에 빠져보자.
“공항은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쌓아놓았지만 마지막 순간 햇빛 속으로 나오려 발버둥치는 진실들로 북적거렸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온갖 것을 할 수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을 꼭꼭 숨길 수 있었다. 사랑을 뒤에 끌고 다닐 수도 있었다. 사랑을 높이 들거나, 사랑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꽃다발에 차곡차곡 쌓아 넣을 수도, 땅에 파묻거나 하늘에 날려보낼 수도 있었다. 사랑은 그 모든 것과 함께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이웃과 가족, 그럼에도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루이제의 모습은 우리 삶의 투영이다. 그래서일까. 독일이라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현실 같은 느낌이 든다.
가볍게 읽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사춘기 연예소설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하나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놀라운 삶의 통찰이 반짝이는 소설이다.
마리아나 레키 지음 / 황소자리 출판사 펴냄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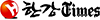 주요뉴스
주요뉴스